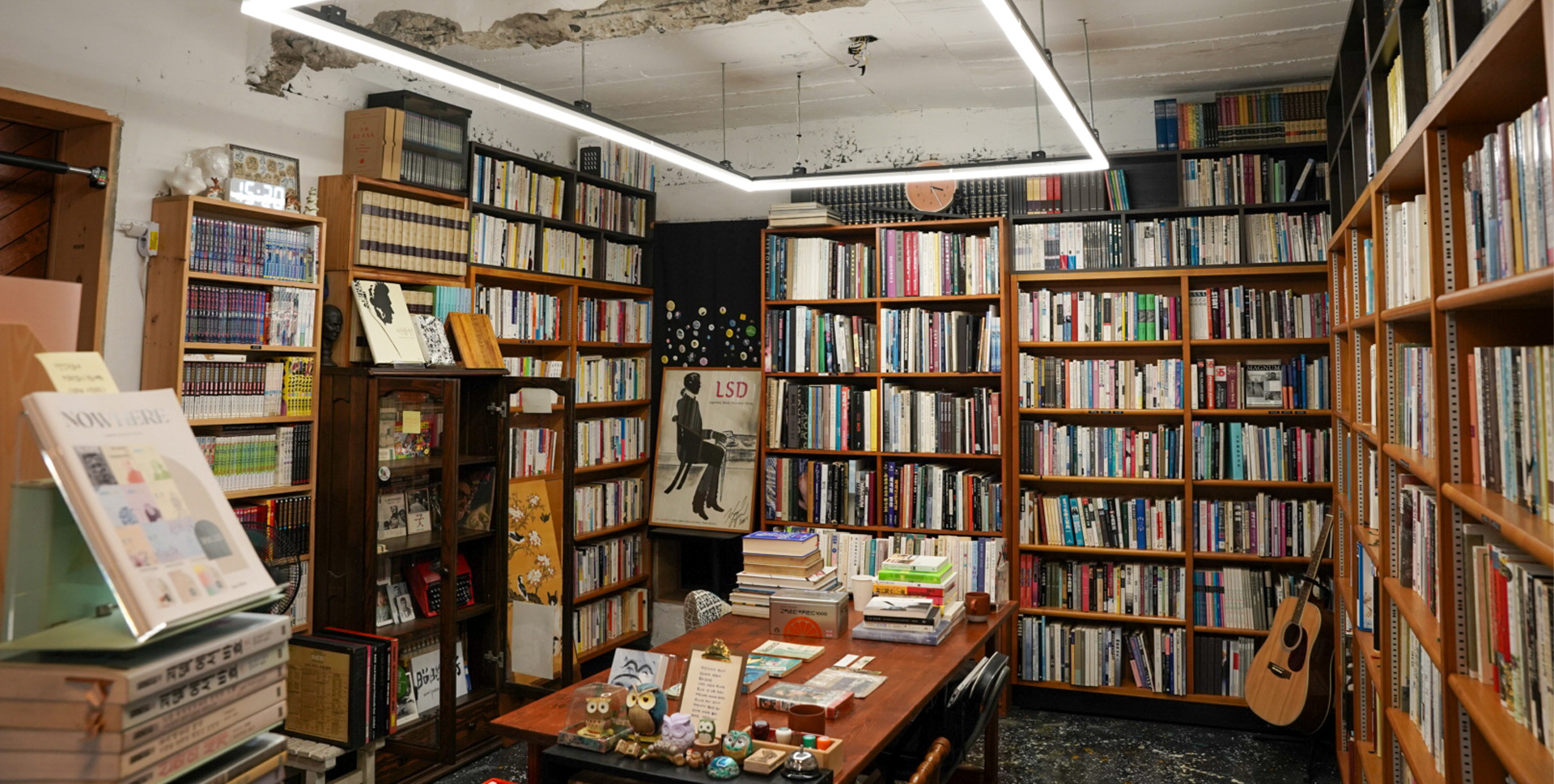飮食·料理
진주를 맛보다
남강진미(南江眞味) 어탕국수
푸드칼럼니스트 권문정

옛적 남강을 따라 살아가던 이들에게 잉어와 붕어, 쏘가리, 꺽지, 피라미, 모래무지 같은 민물고기는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단백질의 원천이었다.
먹을거리가 늘 부족했던 시절, 강에서 건져 올린 민물고기를 푹 고아 낸 국물에 배추나 우거지를 듬뿍 넣어 풍성하게 만든 다음에 국수를 말아 끓이면 많은 이들의 주린 배를 푸근히 달래 주는 넉넉한 음식이 되었다.
산과 강이 내어 준 재료로 빚어진 어탕국수는 영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푸른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큰 솥에 끓여 함께 나누어 먹던 그 시절의 따스한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어탕국수를 즐기는 방법


겨울이 온화한 서부 경남에서는 예로부터 보리와 더불어 겨울철 이모작 작물로 밀을 재배해 왔다.
그래서 밀 수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밀가루로 빚은 국수와 수제비를 즐겨 먹었고, 지금도 진주 곳곳에는 오래된 국숫집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강에서 건져 올린 민물고기를 푹 고아 낸 육수에 국수를 말아 내는 어탕국수는 진주만의 특별한 맛을 지닌다. 어탕국수는 다른 국수처럼 면을 먼저 들이키기보다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천천히 떠올려 시원한 맛을 음미하는 것이 좋다.
목을 축인 뒤에 깊고 시원한 육수의 풍미가 스며든 쫄깃한 면을 국물과 함께 맛보면 “한 번도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음식 중의 하나가 어탕국수임을 알게 된다. 이 육수에 국수 대신 수제비를 넣으면 어탕수제비, 밥을 말아 끓이면 진한 어죽이 되어 또 다른 별미로 즐길 수 있다.

식탁에 오르는 일상의 음식에는 그 고장의 자연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도시를 감싸 흐르는 맑은 남강에 투망을 던지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민물고기를 솜씨 좋은 아낙들이 지혜롭게 활용해 빚어낸 음식이 바로 어탕국수이다. 비린내를 잡아 주는 된장으로 간을 하고, 토속 허브인 방아와 제피로 향을 더해 냄새를 한번 더 다스린 뒤에 국수를 넣어 든든함을 더한다.
그렇게 완성된 어탕국수는 진주의 자연과 풍습이 고스란히 담긴 귀한 한 그릇 음식이다.





어탕국수 만드는 법
- 1
민물고기는 내장을 제거하여 깨끗이 씻은 후에 물을 넉넉히 넣고 2~3시간 푹 삶은 후 체에 걸러 뼈를 발라낸다.
- 2
배춧잎이나 얼갈이배추는 살짝 데쳐 된장과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조물조물 무쳐 밑간한다.
- 3
어탕에 밑간한 채소를 넣고 한소끔 끓여 낸 후 국수를 넣는다.
- 4
국수가 익을 무렵 방아, 깻잎, 다진 파, 고추를 넣고 한소끔 더 끓인다.
- 5
기호에 따라 들깻가루와 제피, 부추 등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이 더 풍부해진다.

방아는 다른 풀의 향을 밀어낸다고 해서 ‘배초향’이라고도 한다.
경상도의 토속 허브로 경상도 이북 지방에서는 구하기도 힘들고 먹는 사람도 드물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대부분이 좋아하는 토속 허브이다.

어탕국수, 서민의 보약


소는 귀한 노동력이었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잔칫날에나 맛볼 수 있던 시절, 남부 내륙 지방에서는 투망만 던져도 쉽게 잡히는 민물고기가 중요한 단백질의 급원이었다.
육류보다 소화가 잘되고,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어탕국수는 위장이 약한 노약자나 회복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 보충식이다. 오래 끓이는 과정에서 우러나온 칼슘과 콜라겐은 뼈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천연 영양제 역할을 한다. 여기에 함께 넣어 먹는 방아는 식욕을 돋우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들깻가루는 뇌와 혈관 건강에 이로운 효능이 있다.

진주의 곳곳에는 매일 정성스럽게 어탕을 끓이고 국수를 삶아 내는 맛깔스러운 어탕국숫집들이 있다. 특히 남강변을 따라 자리한 어탕국숫집들은 남강에서 건져 올린 민물고기를 푹 고아낸 깊고 시원한 맛으로 손님을 맞이한다.
민물고기 요리가 낯선 분들도 망설이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탕국수 한 그릇에 담긴 진주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보시기를 바란다.
- 푸드칼럼니스트 권문정 -